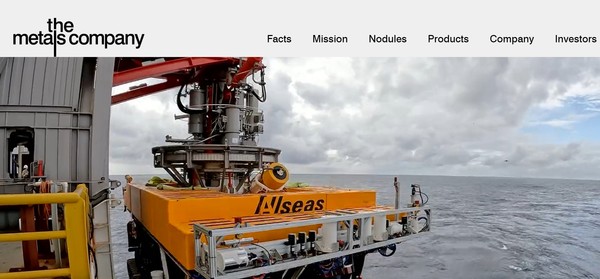
지난 해부터 심해채굴 허용에 대한 글로벌 합의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가운데, 메탈스 컴퍼니(Metals Company)가 이달 초 심해채굴을 하겠다고 로드맵을 발표해서 논쟁이 더욱 치열해졌다고 CNBC가 4일(현지시각) 전했다.
메탈스는 2011년에 캐나다에서 설립되었으며 올시즈(Allseas), 글렌코어(Glencore)와 같은 전략적 파트너, 금융 기관, 벤처 펀드 등으로부터 4억달러(약 5257억원)를 조달했다. 메탈스는 해저 '망관단괴(nodule)'에서 저충격 배터리 금속을 탐사하는 회사로 해저에서 로봇을 사용한다.
메탈스는 8일(현지시각) 세계 해양의 54%를 지배하는 규칙을 규율하는 정부간 기구인 국제해저기구(ISA)의 내년 7월 회의 이후에 심해채굴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메탈스는 "검토에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2025년 4분기에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탈스가 노리는 심해 광물은 태평양의 망간단괴다. 하와이에서 동남쪽으로 2000킬로미터 떨어진 해저 5킬로미터 깊이의 ‘클라리온-클리퍼톤 단열대(CCFZ)’가 채굴 지역이다. 세계적으로 부족한 배터리 원료를 대량 생산하는 것이 망간단괴 채굴 목적이고, 2024년 채굴 로봇의 상용화가 목표다.
망간단괴는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 등 40여종의 금속 물질을 함유한 광물 덩어리로 여러 성분 중 망간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망간단괴라 한다. 망간단괴의 전 세계 매장량은 약 1.7조 톤으로 주로 태평양이나 인도양의 깊은 바다에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심해채굴에 관한 정해진 규정이나 환경 기준이 없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은 국제해저기구(ISA)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심해 채굴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자메이카에서 열린 이번 국제회의는 심해채굴이 승인되는가 여부에 관심을 끌었다. 심해 채굴이 승인되면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을 해저에서 채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해저기구는 심해 채굴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합의했다.
심해채굴의 반대론자들은 해저가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 해양 생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물들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되므로 반대한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금속 단괴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해에서 금속 단괴를 수집하는 것이 오히려 육상이나 비인간적인 노동을 사용한 채굴보다 생태계에 더 낫다고 반박한다.
국제해저기구에서 심해 채굴 관련 규칙 마련 중
블룸버그와 로이터에 따르면, 국제해저기구(ISA)는 이사회 회의와 회원국 총회를 통해 2024년까지 채굴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국제해저기구는 보도자료에서 "이사회는 내년으로 예정된 회의까지 채굴 규정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고 밝혔으나 시한에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
또한, 국제해저기구는 논란이 되는 규정 중 하나인 '채굴 신청서가 들어오면 2년 안에 검토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할 지 다음 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탈스는 지난 2022년 해저에서 지표면으로 3000톤 이상의 망간 단괴의 인양에 성공했으며, 이후 메탈스의 자회사인 모리(NORI)와 파트너사인 올시즈(Allseas)는 시스템의 생산 능력을 연간 130만 톤에서 연간 300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메탈스는 공해상에서 심해 채굴을 허용하기 위해 최종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하는 로드맵에 동의한 국제해저기구의 결정에 찬성했다. 그러자 심해 채굴에 반대하는 심해 해양 생물학자인 디바 아몬(Diva Amon)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나라와 관계자들이 보도에 상당히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심해 채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컸던 적은 없었다. 어업 분야에서부터 금융가, 원주민, 과학자,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그렇다"고 성명서에서 주장했다.
평가기관에 따라 심해채굴 경제성에 다른 의견 내놓아
반발이 이렇게까지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심해 채굴이 채굴업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채산성이 높지 않으며 채굴 이후 복원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기차의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전문인 BMI(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의 지속가능성 책임자인 샬럿 셀비 밀러(Charlotte Selvey Miller)는 망간단괴에 있는 광물이 육지에서도 발견된다고 CNBC에 말했다.
밀러는 "육지 기반 광물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재활용을 고려하더라도 자사의 예측에 따르면 이르면 코발트는 2026년, 니켈은 2027년에 적자가 발생할 것"라고 말했다. 또한, BMI의 분석에 따르면 메탈스의 심해 채굴은 "전통적인 육상에서 채굴한 것보다 지구 온난화 잠재력이 54~70% 낮다"고 밝혔다.
다만, 밀러는 BMI의 분석이 생물 다양성과 같은 모든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지는 않으며, BMI가 심해 채굴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환경 평가는 채굴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 6월에 발표한 NGO 플래닛 트래커(Planet Tracker)의 보고서는 심해의 바닥을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방 킬로미터 당 530만~570만 달러(약 69~75억원) 사이일 것이며, 이는 채굴 비용의 약 2배로 메탈스가 예상한 단괴의 판매 수익인 평방 킬로미터당 추정한 440만 달러(약 57억원)보다 더 클 것이라고 추정했다.
심해 해양 생물학자인 디바 아몬(Diva Amon)은 CNBC에 "채굴이 진행되면 해저의 손상은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것은 번성하는 생태계다. 많은 동물들이 크기가 작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탈스의 제라드 배론(Gerard Barron)회장은 기후 변화에 대한 시간이 촉박하고 있으며 심해 채굴이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금속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육상 자원에서 금속을 계속 추출하는 것보다 덜 피해를 주는 대안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없어서 더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즉, 심해채굴은 육상 광선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독성폐수 유출, 토양오염 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아동 노동착취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니켈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열대우림과 같이 탄소 저장에 이바지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 매장돼 있지만, 심해저의 광물을 채취할 경우 별도의 채굴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해채굴에 많은 기업과 국가가 관심이 있지만 모두가 심해채굴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SDI, 볼보(Volvo), BMW, 구글 등은 "심해채굴의 안전성이 입증되기까지 심해채굴을 하지 않겠다"며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의 심해채굴 방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또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국인 프랑스, 독일, 피지, 팔라우, 사모아 등 12개국의 지도자들도 심해채굴을 중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